검찰, 영포빌딩 압수수색
검찰은 밤사이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이 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지하 2층이 대상이었다. 26일밤 10시 반,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은 건물 대부분의 불이 꺼진 상태였다. 불이 꺼진 좁은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 철문 2개를 통과하면 길게 뻗은 복도를 사이에 둔 양쪽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사무실 안에서 상자에 담겨 있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검토하던 수사관들이 황급히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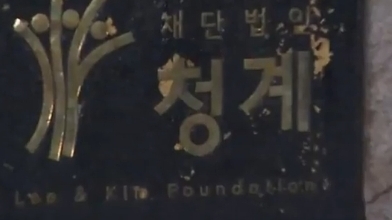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어젯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비자금 전담 수사팀이 압수수색한 지 2주 만에 같은 건물을 다시 압수수색한 것이다. 당시엔 다스 서울지사가 자리한 2층과 청계 재단 사무국장 이 모 씨의 책상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데 비해, 이번엔 검찰이 지하 2층만을 콕 찍었다.

압수물이 담긴 상자 겉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검찰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 공간에 수사관들을 급파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 자료가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진술이나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최대주주인 이상은 회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 회장의 아들 동형 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BBK로부터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스포츠닷컴 사회팀











 청년실업 심각, 문 대통령 직접 나서
청년실업 심각, 문 대통령 직접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