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체감 전세가격 평균 1,400만원 상승 전망
개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하면서 전세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전세 공급 부족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임차가구들의 주거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시장 인식과 관련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체감 전월세가격과 주거비 관련 인식
첫째, 응답자들은 실제보다 체감 전세가격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전세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응답자들의 평균 체감 전세가격은 1억 8,000만원으로 실제 평균 주택전세가격 1억 5,900만원을 2,100만원 상회(실제 대비 13.2%)하였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지역(2억 3,100만원)과 보유 중인 주택가격이 비교적 높은 고소득층(1억 9,800만원), 전세가구(1억 8,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들은 내년 전세가격이 평균 1,400만원(체감 대비 7.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서울에 사는 30대 전세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1년 후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63.5%에 달한 반면, 하락은 5.8%에 불과했으며, 1년 후 주택가격은 평균 1,400만원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전세 비중이 높은 30대(1,725만원, 체감 대비 9.6%)와, 전세거주자(2,000만원, 체감 대비 10.9%)가 높았으며,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지역(2,207만원, 체감 대비 9.8%)도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전세가구의 전세가격 부담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응답자들의 체감 월세가격은 58만원으로 실제(56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며, 1년 후 월세가격은 평균 5만원(체감 대비 8.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월세가격이 비싼 서울의 체감 월세가격이 71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넷째,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월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은 14.9%이나 실제 RIR은 24.2%에 달해 임차료 부담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가구의 적정 RIR은 14.4%로 자가와 전세(각각 14.9%, 15.1%)에 낮게 나타났고, 이는 실제로 매달 지출되는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주거비(전월세 및 원리금 부담)로 생계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43.2%이며, 특히 30~40대(각각 53.0%, 49.5%), 저·중소득층(각각 50.3%, 49.5%), 전월세가구(각각 60.5%, 64.2%)가 높았다.
여섯째, 응답자의 절반은 주거비로 인해 소비를 줄였고, 특히 문화여가비와 저축·보험을 크게 줄였다. 주거비로 소비를 줄인 응답자는 43.6%이며, 주거비로 인한 생계부담과 마찬가지로 ‘30~40대 저·중소득 임차가구’의 소비 위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비 위축 부문은 문화여가비(34.7%)와 저축 및 보험(30.1%)으로 응답됐다. 특히 문화여가비는 ‘20대 저소득층 월세가구’에서, 그리고 저축 및 보험은 ‘50대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필수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의료비(12.0%)를 줄였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응답자들은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가장 선호했다. 정부의 전월세난 완화 정책들 가운데 ‘공공임대주택’(42.4%),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26.3%),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도입’(18.9%) 등을 선호했다. 특히 ‘저소득 월세가구’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선호했다.
시사점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공급 확대 및 전월세 수요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전월세가격 안정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월세 수급 조절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공급측면에서는 민간임대주택 확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임차가구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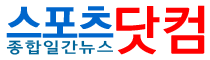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 연말연시 후유증 시달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 연말연시 후유증 시달려
 여야 '선거구 담판' 실패
여야 '선거구 담판' 실패








